


|
하늘을 여는 미래: 비행 택시, 도시 교통의 새로운 장 | |||
| 도시 교통의 혼잡과 지연이 임계점에 다다른 지금, '전기 수직 이착륙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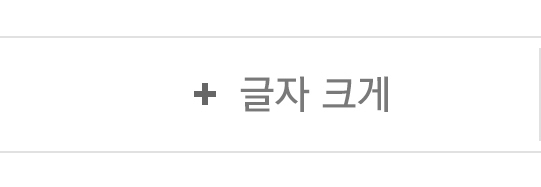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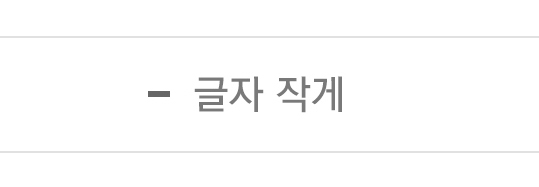 |
 |  |
 |
하늘을 여는 미래: 비행 택시, 도시 교통의 새로운 장
도시 교통의 혼잡과 지연이 임계점에 다다른 지금, '전기 수직 이착륙기(electric Vertical Take-Off and Landing aircraft, eVTOL)'는 하늘을 새로운 도로로 바꾸고 있다. 이 기술은 단순히 빠른 이동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 구조, 산업 생태계, 생활 방식을 동시에 재설계하는 '공중 교통 혁명(urban air mobility revolution)'의 서막을 알리고 있다.
특히 중국의 '이항(EHang)'은 세계 최초로 eVTOL 상업 운항 인증을 모두 획득하며 글로벌 항공 산업사에 굵직한 획을 그었다. 그러나 이항만이 이 분야의 주인공은 아니다. 미국, 독일, 일본, 한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가 각자의 방식으로 하늘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글로벌 eVTOL 시장: 성장과 가능성
세계 eVTOL 시장은 202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폭발적인 성장 곡선을 그리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분석에 따르면, 2024년 약 3억 5천만 달러 수준이던 시장은 2034년 270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부 보고서는 2035년 5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내다본다.
이러한 성장세의 배경은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교통 혼잡 완화(traffic congestion relief)' 필요성이다. 뉴욕, 런던, 서울 등 인구 밀집 도시에서는 도로와 철도의 확장이 이미 물리적 한계에 부딪혔다.
둘째, '배터리와 전기 추진 기술 발전(advancements in battery and electric propulsion)'이다. 고출력 '전기 모터(electric motor)'와 경량 '복합소재(composite materials)'의 상용화가 eVTOL 제작을 현실화했다.
셋째, '환경 규제 강화(environmental regulations)'다. 탄소중립(carbon neutrality) 목표를 위해 각국 정부가 저탄소·무배출 이동 수단에 투자하고 있다.
수요는 초기의 '프리미엄 비즈니스 이동(premium business travel)'과 '관광(tourism)'을 넘어, '응급 의료(emergency medical services)', '화물 운송(cargo transport)', '공항-도심 셔틀(airport-city shuttle)', '장거리 통근(long-distance commuting)'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다.
선두 기업들의 전략과 도전
미국의 '조비 에비에이션(Joby Aviation)'은 '연방항공청(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FAA)' 인증 절차를 진행 중이며, 2026년 두바이 상업 운항, 2028년 LA 올림픽 UAM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한다. '아처 에비에이션(Archer Aviation)'은 뉴욕-뉴어크 노선 개통을 추진하고, '위스크 에어로(Wisk Aero)'는 완전 '자율 비행(full autonomous flight)' 기체 개발에 집중한다. '베타 테크놀로지스(Beta Technologies)'는 전기 '고정익 항공기(fixed-wing aircraft)'로 농촌 및 산간 지역 시장까지 확장하려 한다.
독일의 '릴리움(Lilium)'은 최대 항속거리 300km 이상의 ‘릴리움 제트(Lilium Jet)’를 개발하며 장거리 고속 UAM 시장을 겨냥한다. '볼로콥터(Volocopter)'는 단거리 도심 이동에 특화된 ‘볼로시티(Volocity)’를 통해 파리 올림픽 시범 운행을 계획하고 있다.
일본은 2025년 오사카·간사이 엑스포에서 '스카이드라이브(SkyDrive)'의 eVTOL을 활용한 시범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일본 국토교통성은 ‘도심 항공 모빌리티 로드맵(Urban Air Mobility Roadmap)’을 수립하고 2030년대 상용화를 목표로 규제와 인프라를 정비 중이다.
한국은 '현대자동차그룹(Hyundai Motor Group)'이 2028년 상용화를 목표로 UAM 개발을 추진 중이다. 미국 시장에서는 ‘슈퍼널(Supernal)’ 브랜드로 진출을 준비하며, 김포공항–서울 도심, 인천공항–송도 노선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K-UAM 그랜드 챌린지(K-UAM Grand Challenge)’를 운영하며, 민관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이항(EHang): eVTOL 상업화의 전초기지
중국의 이항은 광저우에 본사를 둔 eVTOL 전문 기업으로, 규제 기관과의 전략적 협업을 통해 상업화를 앞당겼다. 주력 모델인 'EH216-S'는 2023년 '형식증명(Type Certificate)', '항공성능 적합성 인증(Airworthiness Certificate)', '생산증명(Production Certificate)', '운항증명(Air Operator Certificate)'을 모두 취득했다. 이 네 가지 인증을 모두 획득한 eVTOL은 전 세계에서 EH216-S가 유일하다.
EH216-S는 최대 2인승, 최고 속도 130km/h, 비행 거리 약 30km를 제공하며 완전 자율 비행이 가능하다. 다중 '센서(sensor)' 기반 '충돌 회피 시스템(collision avoidance system)', '원격 관제(remote control)', '비상 착륙 알고리즘(emergency landing algorithm)'을 탑재해 안전성을 높였다.
이항은 광저우와 허페이에서 유료 관광 비행을 시작했고, 중국 정부의 '저고도 경제(low-altitude economy)' 전략에 따라 2030년까지 전국 주요 도시에 네트워크형 '버티포트(vertiport network)'를 구축할 계획이다. 시장 규모는 3조 위안(약 3260억 달러)로 예상된다.
인프라 구축과 최신 기술 대응
eVTOL 운항의 핵심은 '버티포트(vertiport)'다. 미국 뉴욕 맨해튼은 기존 헬리포트를 eVTOL 전용으로 개조하고 있으며, 두바이는 도심·공항·관광지를 연결하는 4개 이상의 버티포트를 건설 중이다. 런던 히드로 공항과 도심을 잇는 버티포트 계획도 진행 중이다.
기술적으로는 '초고속 충전 시스템(ultra-fast charging system)', '배터리 교체형 설계(battery swap design)', '인공지능 기반 항로 최적화(AI-based route optimization)'가 주목받는다. 독일은 항공관제와 UAM을 통합한 '디지털 스카이(Digital Sky)' 시스템을 개발 중이며, 일본은 '5G'와 '위성 통신(satellite communication)'을 결합한 실시간 항로 관리 시스템을 시험하고 있다.
사회·환경적 시사점과 과제
eVTOL의 상용화가 가져올 사회적 변화는 단순히 교통 효율성 향상에 그치지 않는다.
우선 '도시 구조의 재편'이 가능하다. 기존 대중교통망이 철도·도로 중심이었다면, eVTOL은 도심과 외곽, 섬 지역, 산악 지역을 직접 연결하는 '3차원 네트워크(three-dimensional network)'를 형성한다.
예를 들어, 서울과 인천공항 간 이동은 현재 1시간 이상 소요되지만, eVTOL을 활용하면 10분 내외로 단축된다. 이는 단순한 편리함 이상의 효과를 낳는다. 고가의 도심 부동산 중심에서 벗어나 외곽 거주가 늘어나고, 거점 간 생활·업무권이 재편될 가능성이 있다.
'경제적 파급효과'도 크다. 도심 항공 모빌리티(Urban Air Mobility, UAM) 산업은 항공기 제작, 인프라 건설, 소프트웨어, 배터리 기술, 관제 시스템, 서비스 운영 등 다양한 분야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미국의 경우 UAM 산업이 본격 상용화되면 약 28만 개 이상의 직접·간접 고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연구가 있다. 한국도 버티포트 건설, 운항 서비스, 유지보수, 관제 인력 등에서 신규 고용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환경적 측면'에서는 이점과 한계가 공존한다. eVTOL은 전기 추진을 사용하기 때문에 비행 중 '탄소 배출(carbon emission)'이 거의 없다. 기존 헬리콥터와 비교하면 소음도 최대 90% 이상 줄어든다. 이는 도심·관광지에서의 주민 반발을 크게 완화할 수 있는 요소다. 그러나 제조 단계에서의 배터리 생산, 에너지 사용원, 폐배터리 처리 과정에서 환경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만약 전력원이 화석연료 기반이라면, ‘무탄소 운항’의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
'안전성 확보'는 여전히 가장 중요한 과제다. eVTOL은 기존 상업용 항공기보다 훨씬 복잡한 저고도 환경에서 운항하기 때문에, '충돌 회피 시스템(collision avoidance system)', 기체 내·외부 센서, 비상 착륙 절차의 완성도가 필수적이다. 자율 비행 시스템의 경우 사이버 보안(cybersecurity) 위협까지 고려해야 한다. 악의적인 해킹으로 경로를 변경하거나 운항을 방해할 가능성은 ‘공중판 랜섬웨어’라는 새로운 위험군을 만든다.
'사회적 수용성(public acceptance)' 역시 관건이다. 많은 시민들이 기술의 필요성과 편리성을 인식하더라도, 직접 탑승하려는 심리적 장벽은 높을 수 있다. 2023년 유럽연합(EU)에서 실시한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54%가 “자율 비행 eVTOL에 당장 탑승할 의향이 없다”고 답했다. 초기 상용화 단계에서는 조종사 탑승형 기체와 자율 비행 기체를 병행 운영하며 신뢰도를 높이는 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사회적 형평성' 문제도 있다. 초기 요금이 높게 책정되면 eVTOL은 부유층 중심의 교통수단으로 고착화될 위험이 있다. 이는 ‘하늘길의 양극화’라는 새로운 사회 문제를 만들 수 있다. 따라서 공공 교통망과의 연계, 정부의 보조금 정책, 요금 규제 등을 통해 대중 접근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래 시나리오: 2025년부터 2040년까지
1. 2025~2028년: 시험과 초기 상용화 단계
이 시기에는 중국, 미국, 유럽의 일부 도시에서 본격적인 유상 운항이 시작된다. 두바이, 광저우, 뉴욕, 런던, 오사카 등이 선도 도시로 부상하며, 주로 공항–도심, 관광지 연결, 프리미엄 통근 서비스 형태로 운영된다. 한국은 ‘K-UAM 그랜드 챌린지’를 통해 실증 데이터를 확보하고, 2028년 상용화를 위한 법·제도 기반을 완성한다. 일본은 오사카·간사이 엑스포를 계기로 전국 주요 도시로 확대 계획을 수립한다.
2. 2028~2030년: 본격 상업화와 서비스 다변화
이 시기에는 노선이 대폭 확대된다. 응급 의료(eVTOL ambulance) 서비스, 도심 간 화물 운송, 섬·산간 지역 연결 노선 등이 등장한다. 요금도 점진적으로 하락한다. 특히 배터리 교체형 설계와 초고속 충전 기술의 보급으로 하루 운항 횟수가 크게 늘어난다. 국제적으로는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차원의 eVTOL 운항 표준이 제정되어, 국가 간 규제 조율이 본격화된다.
3. 2030~2035년: 대중교통과의 통합 단계
2030년대 초반에는 eVTOL이 지상 대중교통과 통합된 환승 시스템을 구축한다. 예를 들어, 지하철역에서 바로 버티포트로 이동해 eVTOL을 타고 다른 도시로 이동하는 ‘하늘철도’ 개념이 현실화된다. 일부 국가에서는 항공권 예약 플랫폼과 대중교통 앱이 통합되어, 버스·지하철·eVTOL·기차까지 한 번에 예약·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가 보편화된다.
4. 2035~2040년: 글로벌 하늘 네트워크 완성
이 시기에는 대륙 간 장거리 eVTOL이나 하이브리드(Hybrid) 전기 항공기가 일부 구간에서 시범 운항한다. 북미, 유럽, 동아시아 주요 도시를 잇는 국제 하늘길이 생기고, 여행·물류·비즈니스 이동의 개념이 대대적으로 변화한다. 국가 간 협정을 기반으로 한 ‘국제 도심 항공 네트워크(International Urban Air Mobility Network)’가 가동되며, 일부 항로는 기존 단거리 여객기 수요를 대체한다.
또한, 2040년대 초반이면 기체 제작 단가와 유지비가 충분히 낮아져, eVTOL이 현재의 택시·버스처럼 일반 시민에게 일상적인 교통수단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 시기에도 배터리 자원 확보, 재활용 체계, 기체 노후화 관리, 기후 변화로 인한 기상 불안정 대응 등이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을 것이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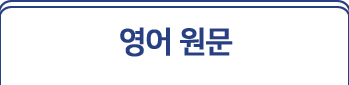 |
 |
Opening the Skies: Flying Taxis as a New Chapter in Urban Transportation
With urban traffic congestion and delays reaching a breaking point, 'electric Vertical Take-Off and Landing aircraft (eVTOL)' are transforming the skies into new roadways. This technology is not merely about providing a faster means of travel—it heralds the dawn of an 'urban air mobility revolution', simultaneously redesigning city structures, industrial ecosystems, and lifestyles.
In particular, China’s EHang has made a significant mark in global aviation history by becoming the first in the world to obtain all certifications required for commercial eVTOL operations. However, EHang is not the only player in this arena. The United States, Germany, Japan, and Korea, among others, are entering the aerial race with strategies of their own.
Global eVTOL Market: Growth and Potential
The global eVTOL market has entered an explosive growth curve since the mid-2020s. According to market research, the market—valued at approximately $350 million in 2024—is projected to grow to $27 billion by 2034. Some reports forecast it surpassing $50 billion by 2035.
This growth can be summarized in three key drivers:
1. Traffic congestion relief. In densely populated cities like New York, London, and Seoul, expanding roads and railways has already hit physical limits.
2. Advancements in battery and electric propulsion. The commercialization of high-output 'electric motors' and lightweight 'composite materials' has made eVTOL manufacturing a reality.
3. Stronger environmental regulations. To meet carbon neutrality targets, governments are investing in low-carbon, zero-emission modes of transportation.
Demand is also diversifying beyond the initial 'premium business travel' and 'tourism' markets into 'emergency medical services', 'cargo transport', 'airport–city shuttles', and 'long-distance commuting'.
Strategies and Challenges of Leading Companies
In the United States, Joby Aviation is pursuing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FAA)' certification, with the goal of launching commercial operations in Dubai in 2026 and providing UAM services for the 2028 Los Angeles Olympics. Archer Aviation is working to open a New York–Newark route, while Wisk Aero is focused on developing fully 'autonomous flight' aircraft. Beta Technologies aims to expand into rural and mountainous markets with electric 'fixed-wing aircraft'.
In Germany, Lilium is developing the 'Lilium Jet', designed for a maximum range of over 300 km, targeting the long-distance, high-speed UAM market. Volocopter plans to operate its short-range, city-focused 'Volocity' during the Paris Olympics.
Japan plans to introduce SkyDrive’s eVTOL for demonstration flights at the 2025 Osaka–Kansai Expo.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Transport and Tourism has created an 'Urban Air Mobility Roadmap' and is preparing the regulatory and infrastructure framework for commercialization in the 2030s.
In Korea, Hyundai Motor Group is targeting 2028 for commercialization. In the U.S. market, it is preparing to launch under the 'Supernal' brand, considering routes such as Gimpo Airport–downtown Seoul and Incheon Airport–Songdo.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is running the 'K-UAM Grand Challenge' to strengthen public–private cooperation.
EHang: Pioneer of eVTOL Commercialization
China’s EHang, based in Guangzhou, has accelerated commercialization through strategic collaboration with regulatory bodies. Its flagship model, the EH216-S, obtained a 'Type Certificate', 'Airworthiness Certificate', 'Production Certificate', and 'Air Operator Certificate' in 2023. It is the only eVTOL in the world to have all four certifications.
The EH216-S seats up to two passengers, has a top speed of 130 km/h, and a range of about 30 km, with fully autonomous flight capability. It is equipped with a multi-'sensor' 'collision avoidance system', 'remote control', and an 'emergency landing algorithm' to enhance safety.
EHang has begun paid sightseeing flights in Guangzhou and Hefei, and under China’s 'low-altitude economy' strategy, it plans to establish a networked 'vertiport network' in major cities nationwide by 2030. The market is projected to reach 3 trillion yuan (about $326 billion).
Infrastructure Development and Technological Advancements
The core infrastructure for eVTOL operations is the 'vertiport'. Manhattan, New York, is converting existing heliports for eVTOL use, while Dubai is building over four vertiports connecting downtown, airports, and tourist destinations. London’s Heathrow Airport also has plans to link to the city via vertiport.
On the technology front, 'ultra-fast charging systems', 'battery swap designs', and 'AI-based route optimization' are gaining attention. Germany is developing the 'Digital Sky' system integrating air traffic control and UAM, and Japan is testing a real-time route management system combining '5G' and 'satellite communication'.
Social and Environmental Implications and Challenges
The commercialization of eVTOL will bring social changes far beyond improved transportation efficiency.
First, it could enable urban restructuring. While existing public transit networks focus on rail and road, eVTOL could form a 'three-dimensional network' directly connecting downtowns, suburbs, islands, and mountainous regions.
For example, travel between Seoul and Incheon Airport currently takes over an hour, but with eVTOL, it could be reduced to under 10 minutes. This would have effects beyond convenience—potentially encouraging more suburban living and reshaping residential–business hubs.
The economic ripple effect will be significant. The Urban Air Mobility (UAM) industry will create jobs in aircraft manufacturing, infrastructure construction, software, battery technology, air traffic management systems, and service operations. In the U.S., full-scale UAM commercialization could generate over 280,000 direct and indirect jobs. In Korea, vertiport construction, operations, maintenance, and control staffing could drive notable job growth.
From an environmental perspective, there are both advantages and limitations. eVTOL uses electric propulsion, producing virtually zero 'carbon emissions' in flight. Compared to helicopters, noise could be reduced by up to 90%, significantly easing community opposition in cities and tourist areas. However, environmental burdens arise during battery production, energy sourcing, and end-of-life battery disposal. If the electricity comes from fossil fuels, the benefits of “zero-carbon flight” could be limited.
Safety assurance remains a critical challenge. Operating in more complex low-altitude environments than conventional aircraft, eVTOL requires perfected 'collision avoidance systems', onboard and external sensors, and emergency landing procedures. Autonomous flight systems must also account for 'cybersecurity' risks, such as malicious hacking that could alter routes or disrupt operations—posing a potential “airborne ransomware” threat.
Public acceptance is another key factor. While many citizens recognize the necessity and convenience of the technology, psychological barriers to boarding remain high. In a 2023 European Union survey, 54% of respondents said they were unwilling to board an autonomous eVTOL immediately. During early commercialization, operating both piloted and autonomous aircraft in parallel could help build trust.
Finally, there is the matter of social equity. If initial fares are set too high, eVTOL risks becoming a transportation mode for the wealthy, creating “sky route inequality.” Ensuring public access through integration with public transport, government subsidies, and fare regulations will be essential.
Future Scenario: 2025 to 2040
1. 2025–2028: Testing and Early Commercialization
Commercial paid operations begin in select cities in China, the U.S., and Europe. Dubai, Guangzhou, New York, London, and Osaka emerge as leading cities, primarily offering airport–downtown, tourist link, and premium commuter services. Korea uses the K-UAM Grand Challenge to gather operational data, complete legal and institutional frameworks, and Japan leverages the Osaka–Kansai Expo to plan expansion to major cities.
2. 2028–2030: Full Commercialization and Service Diversification
Routes expand significantly, including eVTOL ambulance services, intercity cargo transport, and links to islands and mountainous regions. Fares gradually decline. Battery swap designs and ultra-fast charging technology increase daily flight frequency. Internationally, the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ICAO) establishes eVTOL operational standards, spurring cross-border regulatory harmonization.
3. 2030–2035: Integration with Public Transit
eVTOL becomes integrated with ground transit systems. For example, passengers transfer directly from subway stations to vertiports, boarding eVTOLs to other cities—realizing the “sky rail” concept. In some countries, airline ticketing platforms and public transit apps integrate, enabling single-platform booking and payment for buses, subways, eVTOL, and trains.
4. 2035–2040: Completion of a Global Sky Network
Long-distance eVTOLs or hybrid-electric aircraft operate on some intercontinental routes. International sky corridors connect major cities in North America, Europe, and East Asia, reshaping travel, logistics, and business mobility. The 'International Urban Air Mobility Network' launches based on intergovernmental agreements, with some routes replacing short-haul passenger flights.
By the early 2040s, reductions in manufacturing and maintenance costs could make eVTOLs as common as today’s taxis or buses. However, challenges such as securing battery resources, recycling systems, managing aging aircraft, and adapting to weather instability from climate change will remain.

.jpg)
.jpg)
.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