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미국 극우 정치의 부상과 미래 트렌드 | |||
| 오늘날 공화당은 전통적 보수 정당이라기보다, 트럼프와 그의 추종자들이 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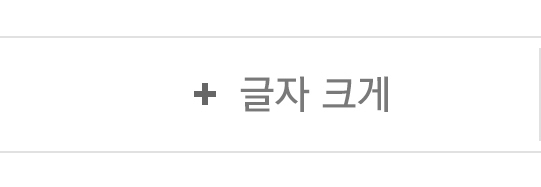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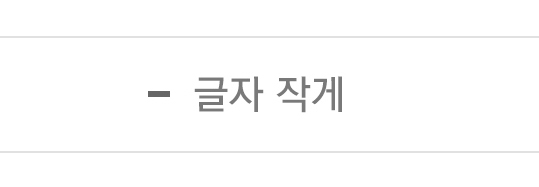 |


 |  |
 |
미국 극우 정치의 부상과 미래 트렌드
극우 정치의 뿌리와 현재
미국 극우 정치의 기원은 남북전쟁 이후 남부 지역에서 등장한 인종차별 체제와 깊이 연관된다. '쿠 클럭스 클랜(KKK)'은 흑인 해방 이후 백인 우월주의를 지키려는 극우 폭력 조직으로, 20세기 초반까지 정치·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후 1950년대에는 매카시즘이 반공주의를 무기로 극우적 정치 선동을 제도화했다.
1970~80년대에는 '로널드 레이건' 시대를 거치며 종교적 보수주의와 자유시장주의가 결합해 새로운 형태의 극우 정치가 뿌리내렸다. 기독교 복음주의 단체는 낙태 반대, 성소수자 권리 제한 같은 이슈를 전면에 내세우며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했고, 이는 21세기 들어 트럼프 지지층의 기반이 되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중산층 몰락과 불평등 심화는 “정치 엘리트와 월가가 미국을 망쳤다”는 불만을 폭발시켰다. 이 시기에 '티파티 운동(Tea Party Movement)'이 등장했으며, 이는 세금 반대, 작은 정부, 반(反)오바마 정서를 중심으로 한 극우 정치 운동이었다. 트럼프의 등장은 이러한 운동의 에너지를 흡수한 결과였다.
오늘날 공화당은 전통적 보수 정당이라기보다, 트럼프와 그의 추종자들이 만든 극우적 에너지를 제도화한 정당으로 변모하고 있다.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 퇴진 사태(2023)'는 공화당 내부에서 극우 성향 의원들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었다.
선동 정치와 미디어의 결합
미국 극우 정치의 핵심 동력은 '선동(demagoguery)'과 '미디어 네트워크'의 결합이다.
2010년대 중반 이후 페이스북, 트위터(현 X), 유튜브는 극우 담론 확산의 가장 강력한 플랫폼이 되었다. “버락 오바마는 미국 시민이 아니다”라는 음모론(버서 운동, Birtherism)은 트럼프가 대중적 정치인으로 부상하는 발판이 되었다.
2020년 대선 이후에는 “선거 사기(Stop the Steal)”라는 구호가 보수 언론과 SNS를 통해 무차별적으로 확산되었다. 트럼프의 변호사였던 '루디 줄리아니(Rudy Giuliani)'와 변호사 '시드니 파웰(Sidney Powell)'은 “도미니언 투표기 조작” 같은 근거 없는 주장을 반복하며 대중적 분노를 조직했다. 이 과정에서 극우 온라인 포럼인 'QAnon'은 “딥 스테이트가 미국을 조종한다”는 서사를 강화했고, 수백만 명의 추종자를 결집시켰다.
이러한 선동은 2021년 1월 6일 '의사당 난입 사건'으로 폭발했다. 당시 시위대는 “트럼프의 부름에 응답했다”고 주장하며 무력을 사용해 의회에 진입했다. 이 사건은 미국 민주주의가 극우적 선동의 직접적 위협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주는 역사적 전환점이었다.
미국 사회의 구조적 갈등
극우 정치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미국 사회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 때문이다.
첫째, '인구학적 변화'. 미국 인구조사국은 2045년경 미국이 ‘다수-백인 사회’를 벗어난다고 전망한다. 이로 인해 일부 백인 보수층은 ‘문화적 대체(Great Replacement)’ 담론에 집착한다. 이는 “이민자들이 전통적 미국인을 대체하고 있다”는 극우적 음모론으로, 실제로 2022년 '버펄로 총기 난사 사건'에서 범인이 이 담론을 언급하기도 했다.
둘째, '경제 불평등과 러스트 벨트의 분노'. 디트로이트, 피츠버그, 클리블랜드와 같은 전통 제조업 도시들은 글로벌화와 자동화로 몰락했다. 일자리를 잃은 백인 노동계급은 민주당이 아니라 “외부의 적을 탓하는” 극우 정치인들의 메시지에 더 강하게 반응했다. 트럼프가 중국과 멕시코를 겨냥한 무역 전쟁을 선언했을 때, 이 지역 노동자들의 지지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이유다.
셋째, '지역 격차와 문화 전쟁'. 해안 도시와 내륙 농촌의 차이는 단순히 소득의 격차가 아니라 가치관의 격차다. 캘리포니아, 뉴욕은 다문화·진보적 가치의 상징이지만, 텍사스, 오클라호마, 알라바마 같은 주는 보수적 기독교 전통과 총기 소유 문화를 유지한다. 이 차이는 2022년 '연방대법원의 낙태권 폐지 판결(Dobbs v. Jackson)' 이후 더욱 뚜렷해졌다. 진보적 주는 낙태권을 보호했지만, 보수적 주는 이를 즉각 금지하며 극우적 가치관을 강화했다.
향후 미국 정치의 가능 시나리오
미국 정치의 미래는 불확실하지만, 세 가지 주요 경로로 그려볼 수 있다.
1. '극우 정치의 제도화'
트럼프 혹은 그와 유사한 지도자가 다시 권력을 잡으면, 극우적 가치가 정당과 정부의 공식 노선으로 굳어질 수 있다. 플로리다 주지사 '론 디샌티스'는 ‘반(反)각성주의’ 정책으로 학교 교과서에서 인종·성소수자 관련 내용을 검열하고 있다. 이런 흐름이 연방 차원으로 확산된다면 미국은 민주적 후퇴(democratic backsliding)의 길을 걸을 수 있다.
2. '강한 반동과 균형 회복'
젊은 세대와 소수민족 집단은 점차 정치적 힘을 키우고 있다. 2020년 대선과 2022년 중간선거에서 대학가와 도시 지역에서의 투표율 증가는 민주당이 승리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했다. 기후위기 대응, 총기 규제, 성평등 문제는 젊은 세대가 극우 정치에 반발하며 집단 행동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는 분야다.
3. '지속적 양극화와 교착'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는 정치적 양극화가 계속되며, 민주당과 공화당이 번갈아 권력을 잡지만 극단적 대립은 해소되지 않는 것이다. 상원과 하원, 연방과 주정부가 서로 다른 정치 노선을 유지하면, 미국은 점점 정책 결정 능력을 상실하고 내적 갈등에 소모될 수 있다. 이 시나리오는 국제 무대에서 미국의 영향력 약화를 동반한다.
글로벌 차원에서의 의미
미국 극우 정치의 강화는 국제 질서에도 심대한 파장을 미친다.
첫째, '동맹 약화'. 트럼프 행정부는 나토(NATO) 회원국들에 방위비 증액을 강요했고, 한국에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올리라고 압박했다. 만약 이런 경향이 지속된다면 동맹국들은 독자적인 방위 체제를 모색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국제안보 구조에 균열을 가져올 것이다.
둘째, '무역·기술 전쟁 심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는 실제 정책으로 구현되었다. 반도체, 배터리, 인공지능과 같은 전략 기술에서 중국을 배제하는 법안(예: 2022년 반도체법, CHIPS Act)은 미국이 극우적 민족주의 경제정책을 제도화한 사례다. 이 흐름은 글로벌 공급망을 파편화하고, 한국·일본·EU 같은 동맹국에도 새로운 전략적 부담을 안긴다.
셋째, '민주주의의 상징성 약화'. 2021년 의사당 난입 사건은 세계인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민주주의의 본산”에서 벌어진 폭력 사태는 권위주의 국가가 “민주주의는 실패한다”는 주장을 강화하는 선전 도구로 활용되었다. 미국의 정치 불안정은 세계 민주주의 전반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
동맹국들의 전략적 태세: 한국·일본·유럽의 선택
미국의 극우 정치가 국제 질서에 불확실성을 가져올 경우, 전통적 동맹국들은 기존의 안보·경제 전략을 재정립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다.
1. 한국: 안보 의존에서 전략적 자율성으로
한국은 전통적으로 미국 안보 우산에 의존해왔다. 그러나 극우적 미국 정부가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워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언급하거나 방위비 분담을 과도하게 요구한다면, 한국은 전략적 자율성을 강화해야 한다.
- 안보적 차원: 한국형 3축 체계(KAMD, KMPR, Kill Chain) 강화, 독자적 미사일 방어체계 확충.
- 외교적 차원: 미국-중국 경쟁 구도 속에서 선택을 강요받지 않도록 다자외교 강화. 예컨대 아세안, 유럽과의 협력 확대.
- 경제적 차원: 반도체, 배터리와 같은 핵심 산업에서 미국 의존도를 줄이고, 유럽·동남아와의 협력을 다변화하는 전략 필요.
2. 일본: 집단안보와 경제안보의 균형
일본은 이미 헌법 해석을 확장하여 집단적 자위권을 강화하고 있으며, 미국과의 동맹을 “보다 대등한 파트너십”으로 전환하려 하고 있다. 만약 미국 극우 정치가 고립주의를 강화한다면, 일본은 다음과 같은 길을 선택할 수 있다.
- 안보적 차원: 자체 군사력 증강, 핵무기 보유 논의 가능성 확대.
- 외교적 차원: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동북아 지역 안보 협력을 심화할 필요. 이는 미국의 불확실성을 상쇄하는 지역적 안정 장치가 될 수 있다.
- 경제적 차원: 미국과의 경제 협력은 유지하되, 인도·호주와 함께 ‘쿼드(QUAD)’를 통한 다자 협력 강화.
3. 유럽: 독자적 전략 자율성 강화
유럽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 나토와의 갈등을 경험했다. 미국이 극우적 고립주의로 회귀할 경우, 유럽연합(EU)과 나토 내부에서 '독자적 전략 자율성(strategic autonomy)'을 강화하려는 목소리가 더 커질 것이다.
- 안보적 차원: 프랑스와 독일을 중심으로 ‘유럽군(European Army)’ 논의 재점화 가능성.
- 경제적 차원: 미국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해 EU 내부 시장 결속 강화 및 중국과의 제한적 협력 가능성.
- 외교적 차원: 기후변화, 디지털 규제 등 글로벌 규범 형성에서 미국과 독립적으로 목소리를 내며, 새로운 ‘규범 리더십’을 추구할 수 있다.
이처럼 한국, 일본, 유럽은 모두 미국 극우 정치의 부상으로 인한 불확실성 속에서 자율성 확보와 다자협력 강화라는 공통 과제를 안게 될 것이다.
**
미국 극우 정치와 선동은 단순한 국내 정치 현상이 아니라, 세계 질서의 안정성까지 뒤흔드는 거대한 흐름이다. 극우 정치가 제도화되면 미국은 민주주의적 정체성을 잃고 세계 리더십을 상실할 수 있다. 반대로 젊은 세대와 다양성 집단이 강력하게 반발하면 새로운 균형이 가능하다. 그러나 가장 가능성이 큰 시나리오는 양극화의 장기화이며, 이는 미국을 점점 더 ‘분열된 국가’로 만들 수 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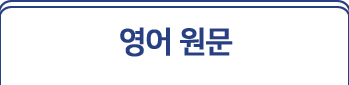 |
 |
The Rise of Far-Right Politics in the United States and Future Trends
The Roots and the Present of Far-Right Politics
The origins of American far-right politics are deeply connected to the system of racial discrimination that emerged in the South after the Civil War. The 'Ku Klux Klan (KKK)' was a far-right violent organization seeking to preserve white supremacy after the emancipation of Black people, and it had a significant impact on politics and society well into the early 20th century. Later, in the 1950s, McCarthyism institutionalized far-right political demagoguery under the banner of anti-communism.
In the 1970s and 1980s, under the 'Ronald Reagan' era, religious conservatism and free-market ideology fused to create a new form of far-right politics. Evangelical Christian groups pushed issues such as opposition to abortion and restrictions on LGBTQ rights to the forefront, expanding their political influence. This eventually became the foundation for Trump’s support base in the 21st century.
After the 2008 financial crisis, the collapse of the middle class and worsening inequality exploded into anger that “political elites and Wall Street have ruined America.” During this period, the 'Tea Party Movement' emerged, a far-right political movement centered on opposition to taxes, small government, and anti-Obama sentiment. Trump’s rise was the result of absorbing the energy of this movement.
Today, the Republican Party has transformed into a party that institutionalizes the far-right energy created by Trump and his followers, rather than remaining a traditional conservative party. The resignation crisis of 'House Speaker Kevin McCarthy (2023)' symbolized how much influence far-right lawmakers wield within the GOP.
Demagoguery and the Media Nexus
The driving force of American far-right politics lies in the combination of 'demagoguery' and 'media networks'.
Since the mid-2010s, Facebook, Twitter (now X), and YouTube have become the most powerful platforms for spreading far-right discourse. The conspiracy theory known as 'Birtherism'—the claim that “Barack Obama is not a U.S. citizen”—became the stepping stone for Trump’s rise as a popular politician.
After the 2020 presidential election, the slogan '“Stop the Steal”' spread indiscriminately through conservative media and social networks. Trump’s lawyer 'Rudy Giuliani' and attorney 'Sidney Powell' repeatedly propagated baseless claims such as “Dominion voting machine manipulation,” organizing widespread public anger. In this process, the far-right online forum 'QAnon' amplified the narrative that “the deep state controls America,” rallying millions of followers.
This demagoguery exploded into the 'Capitol riot on January 6, 2021'. Protesters claimed they were “answering Trump’s call” and forcibly entered Congress. This event marked a historic turning point, showing how vulnerable American democracy is to the direct threat of far-right demagoguery.
Structural Conflicts in American Society
The reason far-right politics has not disappeared lies in the structural problems embedded in American society.
First, 'demographic change'. The U.S. Census Bureau projects that around 2045, America will cease to be a “majority-white society.” As a result, some white conservatives cling to the “Great Replacement” theory, a far-right conspiracy that immigrants are replacing traditional Americans. In fact, the perpetrator of the 'Buffalo mass shooting in 2022' referenced this theory.
Second, 'economic inequality and the anger of the Rust Belt'. Traditional manufacturing cities such as Detroit, Pittsburgh, and Cleveland collapsed under globalization and automation. The white working class that lost jobs responded not to the Democratic Party but more strongly to the messages of far-right politicians who “blamed external enemies.” When Trump declared a trade war against China and Mexico, worker support in these regions skyrocketed.
Third, 'regional divides and cultural wars'. The divide between coastal cities and inland rural areas is not merely economic but deeply cultural. California and New York symbolize multicultural and progressive values, while states such as Texas, Oklahoma, and Alabama maintain conservative Christian traditions and gun culture. This divide became even sharper after the '2022 Supreme Court ruling overturning abortion rights (Dobbs v. Jackson)'. Progressive states protected abortion rights, while conservative states immediately banned them, thereby reinforcing far-right values.
Possible Scenarios for the Future of U.S. Politics
The future of American politics is uncertain, but it can be drawn along three main paths.
1. 'Institutionalization of Far-Right Politics'
If Trump or a similar leader regains power, far-right values may be solidified as the official platform of both the party and the government. Florida Governor 'Ron DeSantis' has pursued “anti-woke” policies, censoring race and LGBTQ content in school curricula. If this trend spreads federally, the United States could walk the path of democratic backsliding.
2. 'Strong Backlash and Restoration of Balance'
Younger generations and minority groups are gradually gaining political power. In the 2020 presidential election and the 2022 midterms, voter turnout in college towns and urban areas played a decisive role in Democratic victories. Issues like climate change response, gun regulation, and gender equality may drive collective action that counters far-right politics.
3. 'Persistent Polarization and Gridlock'
The most realistic scenario is continued polarization, where Democrats and Republicans alternate in power but extreme divisions remain unresolved. If the Senate, House, federal government, and state governments continue to pursue opposing agendas, the U.S. will increasingly lose policy-making capacity and waste energy on internal conflicts. This scenario entails a weakening of America’s global influence.
Global Implications
The strengthening of American far-right politics carries profound implications for the international order.
First, 'weakening alliances'. The Trump administration demanded increased defense spending from NATO allies and pressured South Korea to drastically raise its contribution for U.S. forces stationed there. If such trends continue, allies may have no choice but to pursue independent defense systems, creating fractures in the global security structure.
Second, 'intensifying trade and technology wars'. “America First” has been implemented as actual policy. Laws excluding China from strategic technologies such as semiconductors, batteries, and artificial intelligence (e.g., the 2022 CHIPS Act) are examples of institutionalized far-right nationalist economic policies. This trend fragments global supply chains and imposes new strategic burdens on allies like South Korea, Japan, and the EU.
Third, 'erosion of democracy’s symbolic status'. The January 6, 2021 Capitol riot shocked the world. A violent event in the “cradle of democracy” provided authoritarian regimes with propaganda claiming “democracy fails.” America’s political instability has diminished global confidence in democracy as a model.
Strategic Postures of Allies: Choices for South Korea, Japan, and Europe
If American far-right politics injects uncertainty into the international order, traditional allies will face the need to recalibrate their security and economic strategies.
#South Korea: From Security Dependence to Strategic Autonomy
South Korea has traditionally relied on the U.S. security umbrella. However, if a far-right U.S. government raises the possibility of withdrawing U.S. forces or demands excessive defense cost-sharing under “America First,” South Korea must strengthen its 'strategic autonomy'.
- 'Security dimension': Reinforce the Korean three-axis defense system (KAMD, KMPR, Kill Chain) and expand independent missile defense capabilities.
- 'Diplomatic dimension': Strengthen multilateral diplomacy to avoid being forced into a binary U.S.-China rivalry—for example, expanding cooperation with ASEAN and Europe.
- 'Economic dimension': Reduce dependence on the U.S. in core industries such as semiconductors and batteries, and diversify partnerships with Europe and Southeast Asia.
#Japan: Balancing Collective Security and Economic Security
Japan has already expanded its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to strengthen collective self-defense and seeks to transform the U.S.-Japan alliance into a “more equal partnership.” If American far-right politics intensifies isolationism, Japan may pursue the following:
- 'Security dimension': Enhance independent military capabilities and potentially reopen discussions on nuclear armament.
- 'Diplomatic dimension': Improve relations with South Korea to deepen regional security cooperation, which could serve as a stabilizing counterbalance to U.S. uncertainty.
- 'Economic dimension': Maintain economic ties with the U.S. while reinforcing multilateral cooperation through the “Quad” with India and Australia.
#Europe: Strengthening Strategic Autonomy
Europe experienced tensions with NATO during the Trump administration. If the U.S. reverts to far-right isolationism, calls within the EU and NATO for 'strategic autonomy' will grow louder.
- 'Security dimension': Renew discussions of a “European Army,” led by France and Germany.
- 'Economic dimension': Respond to U.S. protectionism by reinforcing internal EU market cohesion and exploring limited cooperation with China.
- 'Diplomatic dimension': Assert independent voices in global governance on issues such as climate change and digital regulation, pursuing new “normative leadership” apart from the U.S.
Thus, South Korea, Japan, and Europe all share the common task of securing autonomy and strengthening multilateral cooperation amid the uncertainty brought by the rise of American far-right politics.
**
Far-right politics and demagoguery in the United States are not merely domestic political phenomena but powerful currents that shake the stability of the global order. If far-right politics becomes institutionalized, the U.S. risks losing its democratic identity and global leadership. Conversely, strong pushback by younger generations and diverse communities could create a new balance. However, the most likely scenario is prolonged polarization, which will increasingly turn the U.S. into a “divided nation.”
.jpg)
.jpg)
.jpg)
.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