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현금이 사라지면 감각도 사라진다, 디지털 결제의 그림자 | |||
| 현금 없는 사회로의 전환은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한국 역...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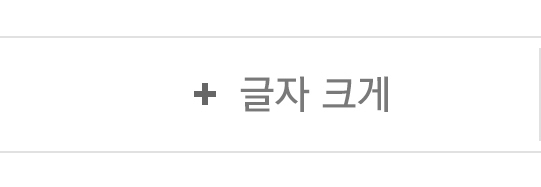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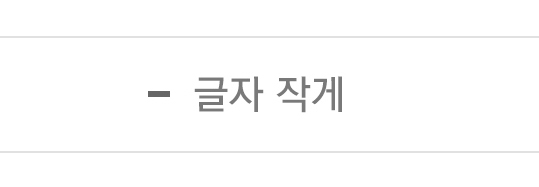 |
 |  |
 |
현금이 사라지면 감각도 사라진다, 디지털 결제의 그림자
현금 없는 사회, 과연 우리는 무엇을 잃고 있는가
현금 없는 사회로의 전환은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한국 역시 예외는 아니다. 카카오페이, 삼성페이, 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 서비스가 일상화되면서, 현금을 꺼내 쓸 일은 점점 줄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우리 소비 습관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이 있을까?
최근 ‘Qualitative Market Research’ 국제 저널에 실린 한 연구는, 현금이 단순한 지불 수단이 아니라, 금전적 책임감과 소비에 대한 자각을 이끄는 심리적 도구임을 강조하며 주목을 받고 있다. 영국 서리대학교(Surrey University)의 연구진은 “현금을 사용할 때 사람들은 돈의 ‘무게’를 실감하지만, 디지털 결제를 통해서는 그런 감각이 사라진다”고 밝혔다.
“현금은 감정과 연결돼 있다”
이번 연구는 뉴질랜드(2013년)와 중국(2023년)이라는 서로 다른 문화와 시기를 배경으로 진행되었으며, 포커스 그룹 인터뷰와 개방형 설문을 통해 소비자들의 생생한 경험을 수집했다. 연구에 참여한 이들은 “현금을 사용할 때 죄책감, 슬픔, 또는 아쉬움 같은 감정을 느낀다”고 답한 반면, “디지털 결제는 숫자만 오갈 뿐, 마치 게임 머니를 쓰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 중국인 참여자는 “디지털 머니는 마치 남의 돈을 쓰는 느낌”이라며, “현금을 쓸 때는 내 자산이 확실히 줄어드는 느낌이 강하다”고 털어놓았다. 이처럼 현금은 물리적 실체가 주는 감각, 즉 만질 수 있고 셀 수 있다는 점에서 강한 심리적 소유감을 형성한다는 것이 이번 연구의 핵심이다.
심리적 소유감, 소비의 자제력을 높이다
연구팀은 이를 ‘심리적 소유감(Psychological Ownership)’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했다. 현금을 만질 때 사람들은 단지 소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일부분’을 내놓는 감각을 경험하게 된다. 반면, 디지털 결제에서는 돈이 손을 거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상태로 사라지기 때문에, 소비에 대한 인식이 약해지고 충동구매나 과소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다.
실제로 중국의 사례를 보면, 전체 결제의 50% 이상이 앱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많은 사용자들이 “지출을 인식하지 못한 채 돈이 사라진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도 흔히 나타나는 현상으로, 카드 명세서나 계좌 내역서를 보고 나서야 ‘이렇게 많이 썼나?’ 하며 놀라는 사람들이 많다.
기술 발전 속, 인간의 감각은 어떻게 진화해야 할까
물론 디지털 결제는 편리함과 보안성을 갖춘 혁신적인 시스템이다. 하지만 연구진은 현금이 완전히 사라지기 전에 우리가 무엇을 잃고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현금은 단지 지폐나 동전이 아니라, 우리가 소비를 인식하고 자제하는 능력과 연결돼 있다”고 말한다.
이에 따라 학계에서는 디지털 결제 시스템 내에 ‘감각적 피드백’을 도입하는 방안도 제안되고 있다. 예컨대 결제 시 손에 진동이 전달되거나, 시각적 애니메이션을 통해 지출을 실감나게 표현하는 기능 등이 그것이다. 혹은 소비자가 일일 지출 한도를 설정하고, 초과 시 경고 메시지를 제공하는 등의 자제 시스템도 연구되고 있다.
한국 사회에 던지는 시사점
우리나라는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디지털 금융 인프라를 갖춘 나라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청년층의 카드 빚 증가, 무분별한 소액결제, 일상화된 리볼빙 사용 등 심각한 금융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이번 연구는 단순한 지불 수단의 논의를 넘어, 우리가 돈을 어떻게 인식하고 관리해야 할지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현금이 줄어드는 시대, 어쩌면 우리는 다시 한번 ‘돈의 감각’을 회복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 시작은 단순히 지갑 속 지폐가 아니라, 자신의 소비를 바라보는 태도와 책임의식일지도 모른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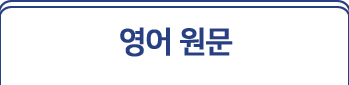 |
 |
When Cash Disappears, So Does Feeling: The Dark Side of Digital Payments
Cashless society — What are we really losing?
The world is quickly moving toward a cashless society. Korea is not an exception. Today, people use easy payment services like KakaoPay, Samsung Pay, and Naver Pay in their daily lives. Because of this, we do not use cash very often anymore. But have we ever seriously thought about how this change affects how we spend money?
A recent study published in the international journal Qualitative Market Research says that cash is not just a way to pay. It helps people feel more responsible and more aware when they spend money. Researchers from Surrey University in the UK said, “When people use cash, they feel the weight of the money. But with digital payments, that feeling disappears.”
“Cash is connected to emotions”
This study was done in two very different places and times: New Zealand in 2013 and China in 2023. The researchers talked to people in focus groups and asked them open-ended questions. This helped them collect real and detailed stories about using cash and digital money.
Many people in the study said they felt guilt, sadness, or regret when they spent cash. But they felt almost nothing when they used digital payments. One person said, “Digital payments feel like using game money. It’s just numbers.”
A person in China said, “Digital money feels like someone else’s money. But when I spend cash, I feel like my own money is really going down.” This shows the most important idea of the study: Cash creates a strong feeling of ownership because it is real, touchable, and countable.
Psychological ownership helps people spend wisely
The researchers call this feeling “psychological ownership.” When people touch and hold cash, they feel like they are giving away part of themselves. But when they use digital payments, the money disappears without being seen or touched. This makes people forget how much they are spending, and they may buy things they do not really need.
In fact, in China, more than 50% of all payments are made through apps. Many users said they did not realize how much they were spending. They only noticed later. This is a common problem in Korea too. Many people are surprised when they see their credit card bills or bank account history.
As technology grows, how should human feeling change?
Of course, digital payments are fast, safe, and very useful. But the researchers warn that we should think about what we may be losing as cash disappears. They say, “Cash is not just coins and bills. It is connected to how we think and control our spending.”
Some experts now suggest adding “sensory feedback” to digital payment systems. For example, when someone pays, the phone could vibrate or show a special animation. This can help people feel their spending more clearly. Other ideas include setting a daily spending limit and sending warning messages when that limit is passed.
A Message for Korean Society
Korea has one of the best digital finance systems in the world. People can pay for almost anything using their phones or cards. But there is a hidden problem. Many young people now have more credit card debt, make too many small payments, and use revolving credit (paying only part of their bills each month) too often. These are serious money problems.
This study gives us more than just ideas about how we pay. It asks a big question: How should we think about and manage our money?
In a world where cash is disappearing, maybe we need to bring back the “feeling” of money. This doesn’t only mean putting cash in your wallet again. It means thinking more carefully about your spending, and taking more responsibility for how you use your money.

.jpg)
.jpg)
.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