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6G 혁명을 예고하는 스핀트로닉스(spintronics) 기반 반도체 | |||
| 극단적으로 빠른 데이터 전송 속도와 낮은 지연이 요구되는 6G 시대를 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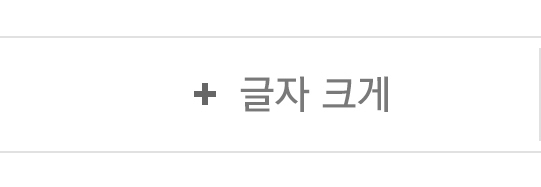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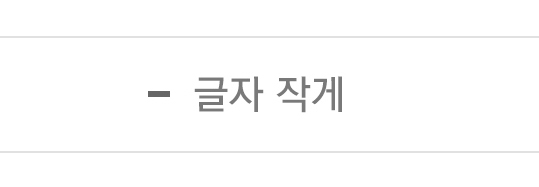 |


 |  |
 |
6G 혁명을 예고하는 스핀트로닉스(spintronics) 기반 반도체
기존 반도체 기술의 물리적 한계를 돌파
5G 시대를 견인한 기존 반도체, 특히 실리콘 기반 트랜지스터는 고주파 신호 전송에서 성능과 전력 효율 면에서 성장의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이와 대비되어 질화갈륨(GaN) 기반 소자는 더 높은 주파수와 전력 밀도를 제공하지만, 구조적 한계와 열 관리 문제로 완벽한 해결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극단적으로 빠른 데이터 전송 속도와 낮은 지연이 요구되는 6G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전혀 새로운 반도체 구조와 작동 원리가 필요하다. 여기에 주목한 것이 바로 스핀트로닉스 기술이며, 이는 기존 전자 장치의 ‘전하’에 더해 ‘스핀(spin)’이라는 전자의 자기 모멘트(회전하는 자기적 성질)를 활용해 정보 처리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기술이다.
스핀트로닉스 기반 질화갈륨 슈퍼래티스 캐슬레이티드 전계효과 트랜지스터(SLCFETs) 구조
영국 브리스톨대학교 연구팀은 *네이처 일렉트로닉스*에 발표된 논문에서 질화갈륨 소재 기반에서 슈퍼래티스 캐슬레이티드 전계효과 트랜지스터 구조를 도입하였다. 이 장치는 수천 개에 달하는 100나노미터 이하의 ‘핀’ 구조를 병렬 배치하고, 질화갈륨 내부의 래치 효과라는 특성을 새롭게 발견하여 고주파 증폭 성능을 극대화한다. 래치 효과는 핀 형태 구조에서 전류 제어가 민감하게 작동하도록 돕는 물리적 현상으로, 이를 통해 75\~110기가헤르츠의 W‑대역 주파수에서 전력 효율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 이러한 구조적 설계는 기존 단일 채널 트랜지스터 대비 성능과 전력 효율을 동시에 개선한 사례로 주목받는다.
실험 결과와 기술적 진전
실험에서는 슈퍼래티스 캐슬레이티드 전계효과 트랜지스터가 W‑대역(75‑110기가헤르츠)에서 동작하는 고주파 증폭기로서, 4.8A/mm급의 전류 밀도와 40% 이상의 전력 첨가 효율을 달성했으며, 94기가헤르츠 대역에서는 10W/mm 이상의 출력이 가능함을 보여주었다. 특히 래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1,000개 이상의 핀을 개별 측정하며 특정 핀에서 전류 급증 현상을 포착했으며, 3D 시뮬레이션과 장시간 테스트를 통해 이 효과가 장치의 신뢰성과 수명을 해치지 않음을 입증했다. 절연층의 고분자 코팅 덕분에 핀 간 균일도가 유지되고 열 안정성이 확보되었으며, 과열 시뮬레이션에서도 질화갈륨 특성이 유지되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는 상용화 가능성을 높이는 매우 중요한 결과로 평가된다.
6G·자율주행·원격 진료 등 응용 확대
이 기술의 적용 가능성은 통신, 의료, 자율주행, 촉각 피드백 등 매우 광범위하다. 6G에서는 테라비트급 속도, 수 밀리초 이하 지연, 초광대역 대역폭이 요구되는데, 이는 새로운 트랜지스터 아키텍처 없이는 구현이 불가능하다. 브리스톨 연구팀은 이러한 구조가 6G 기지국, 위성통신, 엣지 컴퓨팅, 자율주행차 라이다 및 원격 수술 로봇 제어 등에 필수적인 성능을 확보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특히 대역폭 증대와 높은 전력 효율은 자율주행차 센서와 원격 진료 장비의 실시간 데이터 전송을 가능하게 한다. 촉각 피드백과 같은 인간-컴퓨터 상호작용 분야에서도 전송 지연을 줄여 반응성을 높임으로써 인간 수준의 촉감 피드백을 실현할 수 있다.
산업적 확장성과 생태계 영향
이 연구에서는 단기 상용화를 목표로 질화갈륨 기반 슈퍼래티스 캐슬레이티드 전계효과 트랜지스터의 전력 밀도와 인터페이스 설계 고도화를 제안하였다. 반도체 산업에서도 질화갈륨 기반 고주파 소자는 이미 5G와 전력 전송 분야에서 널리 채택되고 있으며, 이번 구조는 기존 반도체 제조 공정과도 비교적 호환되며 확장 가능성이 높다. 산업 파트너들은 이미 상용화를 위한 평가에 착수했으며, 후속 연구로 핀 밀도 증가, 열 관리 최적화, 제조 공정 통합 등이 추진되고 있다. 이는 반도체 공급망, 사물인터넷, 통신 장비 생태계 전반의 변화를 촉진하게 될 것이다. 에너지 소비 감소, 주파수 효율 극대화, 장치 신뢰성 향상은 기술 확산의 핵심 지표가 될 것이다.
과제와 미래 전략
아직은 프로토타입 수준이며, 상용 장치로의 전환을 위한 수명·신뢰성 테스트, 대량 생산 공정 최적화, 주파수 안정성 인증, 국제 규제 및 생태계 표준화 등이 남아 있다. 래치 효과 기반 장치는 열 부하와 장기 작동 안정성 측면에서 추가 검증이 필요하며, 5G와의 호환성과 국제 전파 규제를 충족해야 한다. 동시에 질화갈륨 기판 제조 확대, 패키징 비용 절감, 생산 단가 절감 전략 등이 병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기술은 연구에서 상용까지 3\~5년 내 도약 가능성이 있으며,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구도를 뒤흔들 수 있는 혁신으로 평가된다.
스핀트로닉스 기반 질화갈륨 슈퍼래티스 캐슬레이티드 전계효과 트랜지스터의 의의
결론적으로, 브리스톨대학교 연구팀의 이번 기술은 스핀트로닉스 원리와 래치 효과 구조 설계의 융합을 통해 통신 속도와 에너지 효율의 경계선을 재정의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새로운 트랜지스터가 아니라 6G 시대의 정보기술 패러다임을 뒷받침하는 기반 기술이다. 향후 자율주행, 원격 진료, 촉각 피드백 등 미래 응용 분야에서 스핀트로닉스 기반 반도체는 초저지연, 고신뢰성, 저전력 특성을 통해 인간 경험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 Reference
ScienceDaily, May 22, 2025, “Researchers make breakthrough in semiconductor technology set to supercharge 6G delivery,” University of Bristol.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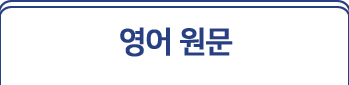 |
 |
The Emergence of Spintronics‑Based Semiconductors Driving the 6G Revolution
Overcoming the Physical Limits of Conventional Semiconductors
Semiconductors that propelled the 5G era, particularly silicon‑based transistors, have now reached their limits in terms of high‑frequency signal transmission, performance, and power efficiency. Even GaN (gallium nitride)‑based devices, which offer higher frequency and power density, face inherent structural and thermal management issues. To meet the extreme demands of the 6G era—ultrafast data transfer speeds and ultra‑low latency—a fundamentally new semiconductor structure and operating principle is required. **Spintronics**, which utilizes not only the electron’s charge but also its spin (magnetic moment), emerges as a promising candidate. By leveraging this property, spintronics can redefine information processing paradigms at the physical level.
Spintronics‑Based GaN SLCFETs Structure
A research team at the University of Bristol introduced in *Nature Electronics* a new GaN‑based architecture called **SLCFETs (superlattice castellated field‑effect transistors)**. The device arranges thousands of sub‑100nm “fins” in parallel within GaN material and exploits a newly discovered property known as the “latch effect” to dramatically enhance RF amplification performance. This latch effect allows highly sensitive current control within the fin structures, enabling exceptionally high power efficiency in the W‑band frequency range (75–110 GHz). This architectural innovation simultaneously improves both performance and power efficiency, surpassing conventional single‑channel transistor designs.
Experimental Results and Technological Progress
In experiments, SLCFETs functioned as RF amplifiers operating in the **W‑band (75–110 GHz)**, achieving a current density of 4.8 A/mm and power‑added efficiency (PAE) exceeding 40%. At 94 GHz, it demonstrated output exceeding 10 W/mm. The researchers conducted detailed measurements across more than 1,000 fins and identified rapid current surges within individual fins—verifying the latch effect through extensive 3D simulations and long‑term tests. Notably, the addition of polymer coatings between fins ensured thermal stability and structural uniformity. These results point to strong commercial potential and operational reliability of the technology.
Expanding Applications in 6G, Autonomous Driving, Remote Healthcare
The applications of this technology extend across telecommunications, healthcare, autonomous driving, and tactile transmission. 6G networks will require terabit‑scale speeds, sub‑millisecond latency, and ultra‑wide bandwidth—all of which demand an entirely new transistor architecture. The Bristol team demonstrated that their SLCFETs design could power 6G base stations, satellite communication, edge computing, LIDAR for autonomous vehicles, and control of remote surgery robots. Enhanced bandwidth and high‑power efficiency will enable real‑time data transfer in autonomous vehicle sensors and medical equipment. In human interaction applications, such as tactile feedback, the reduction of transmission delay will enable human‑level responsiveness.
Industrial Scalability and Ecosystem Impact
The study proposes further optimization of **power density and interface design** for near‑term commercialization of GaN SLCFETs. GaN‑based RF components are already widely used in 5G and power transmission industries, and SLCFETs offer compatibility with existing manufacturing processes. Industry partners are now evaluating the technology for commercialization. Next steps include increasing fin density, optimizing thermal management, and integrating with semiconductor fabrication pipelines. The resulting improvements will significantly influence supply chains, the IoT ecosystem, and the communications hardware sector. Reducing energy consumption, maximizing frequency efficiency, and improving device reliability will be key drivers of adoption.
Challenges and Future Strategy
Currently in prototype stage, the technology must undergo further **lifetime and reliability testing** to transition to commercial products. Optimizing mass production processes, securing frequency stability certifications, and meeting international regulatory standards remain critical tasks. Additional work is needed to ensure long‑term thermal stability, ensure 5G compatibility, and meet global spectrum regulations. Scaling GaN substrate production, lowering packaging costs, and developing cost‑effective production models are parallel priorities. Nevertheless, the technology is projected to achieve commercial viability within **three to five years**, posing a significant challenge to established players in the global semiconductor market.
The Significance of Spintronics‑Based GaN SLCFETs
In conclusion, the University of Bristol’s GaN SLCFETs technology—combining spintronics principles with latch‑effect architecture—redefines the boundaries of communication speed and power efficiency. It represents not merely a new transistor, but the foundation for **a new paradigm in 6G information technology**. Moving forward, spintronics‑based semiconductors will play a pivotal role in enhancing human experience through ultra‑low latency, high reliability, and low power characteristics in applications such as autonomous driving, remote healthcare, and tactile feedback transmission.
* Reference
ScienceDaily, May 22, 2025, “Researchers make breakthrough in semiconductor technology set to supercharge 6G delivery,” University of Bristol.
.jpg)
.jpg)
.jpg)
.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