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람이 줄어드는 경제 | |||
| 출산율은 뉴스의 숫자로 먼저 떨어지고, 경제의 체감으로는 가장 늦게 온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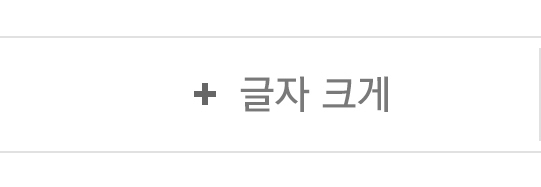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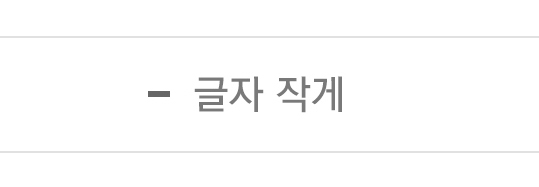 |


 |  |
 |
사람이 줄어드는 경제
출산율은 뉴스의 숫자로 먼저 떨어지고, 경제의 체감으로는 가장 늦게 온다. 하지만 늦게 오는 변수일수록, 한 번 도착하면 오래 머문다. 한국의 초저출산은 지금 ‘문제’가 아니라, 다음 경제 질서의 ‘조건’이 되고 있다.
출산율이 낮아진 세계에서, 한국의 성장과 재정은 어떤 순서로 흔들릴까
물가가 오르면 우리는 당장 체감한다. 금리가 오르면 다음 달의 대출이자에서 확인한다. 하지만 출산율은 다르다. 숫자가 떨어져도 처음엔 조용하다. 뉴스로는 크게 나오지만, 일상은 그대로인 것처럼 보인다. 문제는 그 조용함이 ‘문제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충격이 아직 이동 중이라는 뜻이라는 점이다. 인구는 속도가 느린 변수다. 대신 한 번 움직이면 오래 간다. 그래서 출산율이 떨어지는 사회의 진짜 공포는 당장의 패닉이 아니라, 몇 년 뒤부터 질서가 바뀌는 방식으로 온다. 한국은 그 질서 변화가 특히 빠르게 나타나는 나라다.
낮은 출산율이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기본값’이 될 가능성
2026년 겨울호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는 출산율 하락을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전 지구적 기본 흐름’으로 놓고 시작한다. 여기에서 초점은 원인 진단의 논쟁보다, 지속 가능성의 판단으로 옮겨간다. 낮아진 출산율이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큰지, 아니면 낮은 상태가 오래 유지될 가능성이 큰지다. 출발점부터 수치가 강하게 깔린다. 전 세계 평균 출산은 1950년대 약 5명 수준에서 지금은 2명 초반까지 내려와 있고, 오늘날 인류의 약 3분의 2는 ‘두 성인이 평균 두 명 미만의 아이를 낳는 나라’에서 살고 있다. 즉, 순이민이 없으면 인구 규모가 유지되기 어려운 구간이 이미 표준이 됐다.
여기서 중요한 구분이 하나 등장한다. ‘당장의 연간 출산율’과 ‘한 세대가 평생 낳는 아이 수’는 같은 숫자가 아니라는 점이다. 통계에서 흔히 말하는 합계출산율은 보통 한 해의 연령별 출산 패턴을 합쳐 만든 ‘기간(Period) 지표’다.
반면 인구를 세대 단위로 바꾸는 힘은 결국 ‘코호트(Cohort) 지표’, 즉 특정 출생 세대가 평생 실제로 낳은 아이 수로 측정된다. 이 구분을 붙잡는 이유는 간단하다. 기간 지표는 타이밍에 흔들린다. 출산이 ‘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늦게’ 일어난 것이라면, 한동안 출산율이 내려갔다가 훗날 다시 올라오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예컨대 첫째를 34세에, 둘째를 38세에 갖는 쪽으로 사회가 이동하면, 기간 합계출산율은 한동안 떨어지고, 이후 어느 시점에 다시 튀어 오를 수도 있다. 하지만 그 반등은 가족당 아이 수가 늘었다는 뜻이 아니라, 늦춰졌던 출산이 한꺼번에 잡히는 착시일 수 있다.
그래서 시선은 코호트로 이동한다. 여기에서 던지는 관찰은 냉정하다. ‘평생 기준’으로 출산이 낮아진 곳에서는, 낮아진 뒤에 다시 크게 되돌아온 사례가 거의 보이지 않는다. 중간중간의 반짝 반등이 있더라도, 긴 흐름에서는 내려온 궤도가 유지되는 쪽이 훨씬 강했다. 베이비붐 같은 큰 요동조차도 장기 추세의 예외가 아니라, 일시적 변동으로 처리된다.
무자녀가 늘어서인가, 부모가 덜 낳아서인가
낮은 출산율을 설명할 때 흔히 떠올리는 장면은 ‘무자녀의 증가’다. 하지만 여기에서 더 구체적인 해부가 들어간다. 낮아진 코호트 출산은 두 가지가 겹쳐서 만들어진다. 첫째는 평생 아이를 낳지 않는 비중이 늘어나는 것, 둘째는 아이를 낳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둘째·셋째가 줄어드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가 생각보다 큰 비중을 차지할 때가 많다.
증거는 데이터의 모양으로 제시된다. 코호트 출산이 대체출산율(2.1) 아래로 내려온 집단만 모아 보면, 무자녀 비중은 확실히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같은 코호트 출산 수준에서도 무자녀 비중은 크게 갈린다. 어떤 곳은 무자녀가 25%를 넘고, 어떤 곳은 5% 아래에 머문다. 즉, ‘아이를 안 낳는 사람의 증가’만으로는 낮은 출산율을 설명하기에 부족한 구간이 넓다.
더 결정적인 장면은 ‘부모만 떼어놓고’ 봤을 때다. 무자녀를 제외하고, 아이를 낳는 사람들의 평균 출산이 2.1 아래로 내려간 코호트가 적지 않게 나타난다. 말하자면, 무자녀가 사라져도 출산이 대체수준을 회복하지 못하는 구조가 이미 형성된 사례가 많다는 뜻이다. 낮은 출산율의 본질이 “낳지 않는 사람이 늘었다”만이 아니라 “낳는 사람도 덜 낳게 됐다”로 확장되는 순간이다. 이 지점에서 저출산은 ‘선택의 문제’에서 ‘가족 규모의 재정의’로 넘어간다. 가족의 기본형이 바뀌면, 정책이 건드려야 할 면적도 갑자기 넓어진다.
정책 효과의 착시: 연간 출산율은 움직이지만, 평생 출산은 덜 움직일 수 있다
출산 장려 정책이 왜 늘 논쟁이 되는지도 여기서 더 선명해진다. 정책 연구는 종종 ‘짧은 시간에 반응하는 변화’를 잘 잡는다. 출산휴가, 현금 지원, 보육 지원이 도입되면, 특정 연도에 출생이 늘어나는 신호가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그 증가가 “평생 아이 수가 늘었다”로 이어졌는지는 별개 질문이다. 연간 지표는 타이밍에 민감하니, 정책이 출산을 ‘앞당기게’ 만들면 단기 수치는 올라갈 수 있다. 그러나 그만큼 이후에 출산이 줄어들면 평생 총량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수도 있다.
여기에서 극단적 예시가 등장한다. 루마니아의 ‘데크리 770’이다. 1966년, 임신중단을 금지하고 피임을 사실상 차단하는 강압적 정책이 시행되자, 바로 다음 해에 기간 합계출산율이 거의 두 배로 뛰는 급반등이 나타난다. 연간 지표만 보면 “정책이 출산율을 끌어올렸다”는 결론이 너무 쉬워진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적응한다. 이후 출산은 다시 빠르게 내려오고, 코호트(평생) 기준에서 ‘아이 수가 지속적으로 더 많아졌는가’는 훨씬 불명확해진다. 요지는 이것이다. 단기 출산율의 급변은 정책의 힘을 과대평가하게 만들 수 있고, 인구의 장기 경로를 바꾸는 힘은 그보다 훨씬 완만하거나 제한적일 수 있다.
이런 관점이 한국에 주는 메시지는 단순한데 무겁다. “당장 출산율이 조금 올랐다/내렸다”만으로 장기 전망을 움직이면, 같은 논쟁이 반복된다. 출산이 언제 일어났는지(타이밍)와, 결국 몇 명을 낳았는지(총량)를 구분하지 않으면, 정책도 기업도 계속 착시를 먹는다.
인구 충격이 경제 변수에 퍼지는 시간표
출산율 하락의 파급은 보통 한꺼번에 오지 않는다. 이동한다. 그래서 중요한 건 “얼마나 심각한가”와 동시에 “어떤 순서로 오나”다.
가장 먼저 움직이는 것은 ‘가정의 결정’이다. 혼인 시점이 늦어지고, 첫째 출산이 늦어지고, 둘째가 더 어려워진다. 여기서는 정책이 바로 성과를 내기 어렵다. 사람들은 ‘현금 지원’보다 ‘삶의 구조’를 보고 결정을 바꾸기 때문이다. 안정적인 주거, 예측 가능한 일자리, 양육 부담을 나눌 수 있는 시간과 관계,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를 낳아도 내 삶이 붕괴하지 않는다”는 확신이 필요하다. 이 확신이 없으면 출산율은 반등이 아니라 ‘지연의 축적’으로 더 내려간다.
그다음은 노동시장이다. 눈에 띄는 실업률 변화보다 먼저 나타나는 건 기업의 채용 방식 변화다. 신입이 줄어드는 순간부터 기업은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쪽으로 전략을 바꾼다. 숙련 인력 쟁탈이 시작되고, 임금 격차가 커지고, 자동화·디지털 전환 투자가 가속된다. 제조업은 자동화가 빠르지만, 서비스업은 사람 의존도가 높다. 그래서 인구 충격은 성장률을 깎는 동시에, 서비스 물가와 돌봄 비용을 밀어 올리는 형태로 체감될 수 있다. “출산율이 낮아서 물가가 오른다”는 문장은 어색하지만, “사람이 줄어서 서비스의 가격이 오른다”는 문장은 충분히 현실적이다.
마지막은 재정과 자산시장이다. 여기서부터는 ‘사회 전체의 계산서’가 열린다. 의료·돌봄·연금은 시간이 지날수록 자동으로 커지는 항목이다. 동시에 노동연령 인구가 줄면, 그 비용을 부담할 분모가 줄어든다. 그래서 같은 정책을 유지해도 부담률이 올라간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건 단순히 복지의 크기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다. 사람들은 “내가 낸 돈이 앞으로도 시스템을 지탱할 수 있나”를 의심하기 시작하고, 그 순간부터 저축, 투자, 주거 선택이 바뀐다. 어떤 지역의 집값이 왜 약해지는지, 어떤 지역은 왜 더 비싸지는지, 장기금리가 왜 민감해지는지, 이런 질문의 밑바닥에 인구가 깔리기 시작한다.
한국이 ‘극단값’으로 보이는 이유는 속도다
한국은 출산율 수준도 낮지만, 더 무서운 것은 변화 속도다. 인구구조는 완만하게 바뀌면 사회가 적응할 시간이 생긴다. 하지만 빠르게 바뀌면 적응이 아니라 충돌이 된다. 노동시장 제도, 교육과 취업의 연결 방식, 주거 구조, 돌봄 시스템, 연금과 의료의 설계가 한꺼번에 시대에 뒤처지기 시작한다. 그리고 뒤처진 제도는 결국 ‘개인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버틴다. 개인이 버티는 동안 출산은 더 늦어지고 더 줄어든다. 구조가 결정에 영향을 주고, 결정이 다시 구조를 강화하는 고리가 만들어진다.
핵심은 여기다. 출산율을 문화나 캠페인의 문제로만 보면 해법이 자꾸 감정으로 흐른다. 반대로 코호트 기준의 ‘총량’과 기간 기준의 ‘타이밍’을 분리해 보면, 무엇을 바꾸기 어려운지부터 드러난다. 그리고 그 드러남이야말로 전략이 된다. 반등을 기원하는 전망이 아니라, 지속을 전제로 한 대비로 경제의 순서를 다시 그릴 수 있기 때문이다.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 늦게 오지만, 한번 오면 오래 간다
인구 충격은 늦게 온다. 그래서 지금 당장 경제가 괜찮아 보이면, 사람들은 쉽게 안심한다. 하지만 인구 충격은 한 번 도착하면 오래 머문다. 그리고 그때는 되돌리기가 어렵다. 출산율을 단기간에 끌어올리는 정책이 드물기 때문이다. 결국 현실적인 경쟁은 “출산율을 얼마 올렸나”보다 “낮은 출산율이 지속되는 세계에서 누가 더 잘 적응하나”로 옮겨갈 가능성이 크다.
한국 경제가 여기서 경쟁력을 가지려면, 생산성·이민·돌봄·주거·노동시장·재정 지속가능성이 서로 따로 놀지 않아야 한다. 출산율 하나로 모든 걸 해결하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고, 출산율이 낮아도 붕괴하지 않는 시스템을 설계하는 시대가 온다. 이 설계는 화려한 슬로건보다 고통스러운 조정의 영역이다. 하지만 인구는 선택지가 많지 않은 변수다. 선택의 폭이 좁을수록, 정교한 운영이 필요해진다.
앞으로의 전망: 저출산은 ‘사회 문제’가 아니라 ‘거시 변수’가 된다
앞으로 저출산은 뉴스의 단골 소재를 넘어, 거시경제의 기본 조건이 된다. 성장률 전망, 재정 전망, 부동산과 지역 전망, 산업정책과 노동정책이 모두 인구 가정에 의해 갈린다. 그리고 그 인구 가정은 “내년에 반등하겠지”가 아니라 “낮은 상태가 지속될 수 있다”에서 출발할 가능성이 커진다.
요약하면, 한국의 초저출산이 던지는 질문은 “아이를 더 낳게 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만이 아니다. “낮은 출산율이 오래 지속될 때, 우리 경제가 흔들리는 순서를 알고 있는가”다. 충격은 노동시장으로 먼저 스며들고, 그다음 재정과 자산시장으로 이동한다. 그리고 그 이동 속도는 한국에서 특히 빠를 수 있다. 인구는 조용한 변수지만, 결코 작은 변수가 아니다. 조용히 시작해, 구조를 바꾸는 힘이다.
Reference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2026-02-04, “The Likelihood of Persistently Low Global Fertility”, Michael Geruso; Dean Spears
 |  |
 |
A Shrinking-People Economy
Fertility falls first as a number in the news and arrives last as something you can feel in the economy. But the later a variable arrives, the longer it tends to stay once it does. South Korea’s ultra-low fertility is no longer a “problem” to be solved; it is becoming a “condition” of the next economic order.
In a world of lower fertility, in what sequence will South Korea’s growth and public finances be shaken?
When prices rise, we feel it immediately. When interest rates rise, we confirm it in next month’s loan payment. But fertility is different. Even when the number falls, it is quiet at first. It makes headlines, yet daily life seems unchanged. The point is that this quiet does not mean “there is no problem”; it means the shock is still in transit. Demography is a slow-moving variable. But once it moves, it moves for a long time. That is why the real fear of a society with falling fertility is not an immediate panic, but an order that changes starting a few years later. South Korea is a place where that change in order can appear especially fast.
The possibility that low fertility becomes not a “temporary phenomenon” but a “default setting”
The Winter 2026 issue of the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begins by framing fertility decline not as “a problem of a particular region,” but as “a global baseline trend.” The focus here shifts away from debates about diagnosing causes and toward judging persistence: whether lowered fertility is likely to rise again, or whether a low state is more likely to endure. The numbers are laid down forcefully from the outset. The global average fertility level has fallen from about five children in the 1950s to the low twos today, and roughly two-thirds of humanity now live in countries where “two adults, on average, have fewer than two children.” In other words, we are already living in a zone that struggles to sustain population size without net immigration—and that zone has become standard.
A crucial distinction enters here. “Today’s annual fertility rate” and “the number of children a cohort has over a lifetime” are not the same number. What statistics commonly call the total fertility rate is typically a “period” measure, constructed by aggregating age-specific fertility patterns in a single year.
By contrast, the force that reshapes a population at the generational level is ultimately measured by a “cohort” metric—namely, the number of children a particular birth cohort actually has over its lifetime. The reason to hold onto this distinction is simple. Period measures are shaken by timing. If births did not happen “less,” but happened “later,” then fertility can look as if it fell for a while and then rose again later.
For example, if a society shifts toward having the first child at age 34 and the second at age 38, the period total fertility rate may fall for some time and then jump again at some point. But that rebound does not mean that the number of children per family increased; it may be an illusion created by delayed births being recorded all at once.
So the lens moves to cohorts. The observation offered here is cold. In places where fertility fell on a lifetime basis, there are hardly any cases where it later returned in a large way. Even if there are occasional flickers of rebound, over the long run it is far more common for the lowered trajectory to persist. Even major swings like a baby boom are treated not as an exception to the long-term trend, but as a temporary fluctuation.
Is it because childlessness rose, or because parents had fewer children?
When people explain low fertility, the scene that commonly comes to mind is “rising childlessness.” But a more detailed dissection enters here. Lower cohort fertility is produced by the overlap of two forces. First, the share of people who never have children over a lifetime increases. Second, even among those who do have children, second and third births decline. And the second force often accounts for a larger share than many expect.
The evidence is presented in the shape of the data. If you gather only the groups whose cohort fertility has fallen below the replacement level (2.1), the share of childlessness does tend to rise. But even at the same level of cohort fertility, childlessness varies widely. In some places, childlessness exceeds 25 percent; in others, it remains below 5 percent. In other words, there is a broad range where “an increase in people who do not have children” alone is insufficient to explain low fertility.
The more decisive scene appears when you look at “parents only.” Excluding the childless, there are many cohorts in which the average number of births among those who do have children falls below 2.1. Put differently, in many cases the structure is already in place in which fertility does not recover to replacement even if childlessness disappears. This is the moment when the essence of low fertility expands from “more people are not having children” to “even those who do have children are having fewer.” At this point, low fertility shifts from a “problem of choice” to a “redefinition of family size.” When the default shape of the family changes, the surface area that policy must touch suddenly becomes much larger.
The policy-effect illusion: annual fertility can move, while lifetime fertility may move less
This is also where it becomes clearer why pro-natalist policy is always controversial. Policy research often captures changes that respond over a short horizon. When parental leave, cash benefits, or childcare support is introduced, a signal can appear that births increase in a particular year. But whether that increase carries through to “more children over a lifetime” is a separate question. Because annual measures are sensitive to timing, if policy causes births to be “pulled forward,” short-term figures can rise. But if births subsequently fall by a similar amount, lifetime totals may not change much.
An extreme example appears here: Romania’s “Decree 770.” In 1966, when a coercive policy banning abortion and effectively blocking contraception was implemented, a sharp rebound appeared in the very next year, with the period total fertility rate jumping by nearly twofold. If you look only at annual indicators, the conclusion that “policy raised fertility” becomes far too easy.
But over time, people adapt. Fertility then falls again quickly, and whether “the number of children became persistently higher” on a cohort (lifetime) basis becomes far more unclear. The point is this. Sharp short-run swings in fertility can lead to an overestimation of policy power, and the force that changes the long-run demographic path may be far more gradual or limited than that.
This perspective delivers a simple but heavy message for South Korea. If long-run forecasts are moved by nothing more than “fertility went up or down a little right now,” the same debate will repeat. If you do not distinguish when births occurred (timing) from how many births ultimately occurred (total quantity), both policy and business will keep falling for the illusion.
A timetable for how the demographic shock spreads across economic variables
The impact of fertility decline usually does not arrive all at once. It travels. So what matters is both “how severe it is” and “in what sequence it arrives.”
The first thing to move is “household decisions.” Marriage is delayed, the first birth is delayed, and the second becomes harder. Here, policy struggles to produce immediate results, because people change decisions not primarily by “cash support” but by “the structure of life.” Stable housing, predictable jobs, time and relationships that can share childcare burdens, and above all the conviction that “having a child will not collapse my life” are required. Without that conviction, fertility falls not as a rebound but as an accumulation of delay.
Next comes the labor market. What appears before an obvious change in the unemployment rate is a shift in how firms hire. The moment fewer new entrants appear, firms shift strategy from “recruiting” to “retaining.” Competition for skilled workers begins, wage gaps widen, and investment in automation and digital transformation accelerates. Manufacturing tends to automate quickly, but services depend heavily on people. So the demographic shock can be felt as something that cuts growth while pushing up service prices and care costs. The sentence “prices rise because fertility is low” sounds awkward, but the sentence “service prices rise because there are fewer people” is entirely plausible.
Last comes public finance and asset markets. From here, “the whole society’s bill” is opened. Healthcare, care, and pensions are items that automatically grow over time. At the same time, if the working-age population shrinks, the denominator that must finance those costs shrinks. So even if the same policies are maintained, the burden rate rises. What matters at this stage is not merely the size of welfare, but trust. People begin to doubt whether “the money I paid can sustain the system in the future,” and from that moment savings, investment, and housing choices change. This is where fertility becomes linked to asset markets: why house prices weaken in some regions, why they become more expensive in others, why long-term interest rates become more sensitive—under many of those questions, demography begins to sit at the bottom.
Why South Korea can look like an “extreme case” is speed
South Korea’s fertility level is low, but what is even more frightening is the speed of change. If demographic structure changes gradually, society has time to adapt. But if it changes quickly, the result is not adaptation but collision. Labor-market institutions, the link between education and employment, housing structure, the care system, and the design of pensions and healthcare begin to fall behind the times all at once. And institutions that fall behind ultimately survive by “shifting costs onto individuals.” While individuals endure, childbearing is delayed further and falls further. Structure affects decisions, and decisions reinforce structure—a feedback loop is formed.
The core point is here. If low fertility is treated only as a matter of culture or campaigning, solutions keep sliding into emotion. By contrast, if you separate the cohort-based “total quantity” from the period-based “timing,” what is difficult to change reveals itself first. And that revelation becomes strategy. It becomes possible to redraw the economic sequence not as a forecast that wishes for rebound, but as preparation that assumes persistence.
Good news and bad news: it arrives late, but once it arrives, it stays a long time
Demographic shock arrives late. So if the economy looks fine right now, people easily relax. But once the shock arrives, it stays for a long time. And then it is hard to reverse. Policies that raise fertility sharply in the short run are rare. In the end, the more realistic competition may shift from “how much did fertility rise” to “who adapts better in a world where low fertility persists.”
For South Korea to be competitive here, productivity, immigration, care, housing, the labor market, and fiscal sustainability cannot move separately. The era of solving everything with one fertility number has already passed, and the era of designing a system that does not collapse even with low fertility has arrived. That design belongs more to painful adjustment than to flashy slogans. But demography is a variable with few options. The narrower the range of choices, the more precise the operation must be.
The outlook ahead: low fertility becomes not a “social issue” but a “macro variable”
Going forward, low fertility moves beyond being a recurring headline and becomes a basic condition of macroeconomics. Growth forecasts, fiscal forecasts, real estate and regional forecasts, industrial policy, and labor policy all diverge depending on demographic assumptions. And those demographic assumptions are more likely to start not from “it will rebound next year,” but from “a low state may persist.”
In sum, the question posed by South Korea’s ultra-low fertility is not only “what should be done to make people have more children.” It is also “do we know the sequence in which the economy is shaken when low fertility persists for a long time.” The shock seeps into the labor market first, then moves into public finance and asset markets. And the speed of that movement can be especially fast in South Korea. Demography is a quiet variable, but it is never a small one. It begins quietly and changes structure.
Reference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2026-02-04, “The Likelihood of Persistently Low Global Fertility”, Michael Geruso; Dean Spears
.jpg)
.jpg)
.jpg)
.jpg)

